복합문화공간 에무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2010년 출간된 황정은 작가의 첫 장편인 <백의 그림자>로 토론했습니다. 언제나 주변부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글을 쓰는 황정은 작가의 장편에 담긴 에너지를 느껴보며, 은교라는 인물, 무재라는 인물, 슬럼이라고 불리는 세운상가, 1+1이 아니라 전구 한개를 더 주는 오무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발췌해 주신 부분을 번갈아 읽다보니 같은 단어가 반복되게 하면서 기존의 생각을 다시 되짚어 보게 하는 '낯설게 하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토론을 하면서 나게게 있을 폭력적인 사고와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토론 준비하시느라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랫만에 얼굴 뵈어서 참 좋았습니다. 코로나가 피크로 달리지만 정점뒤에는 정리되는 시점이 올거라는 기대도 있는 거지요? 모쪼록 건강히 지내시고 4월 토론에서 뵙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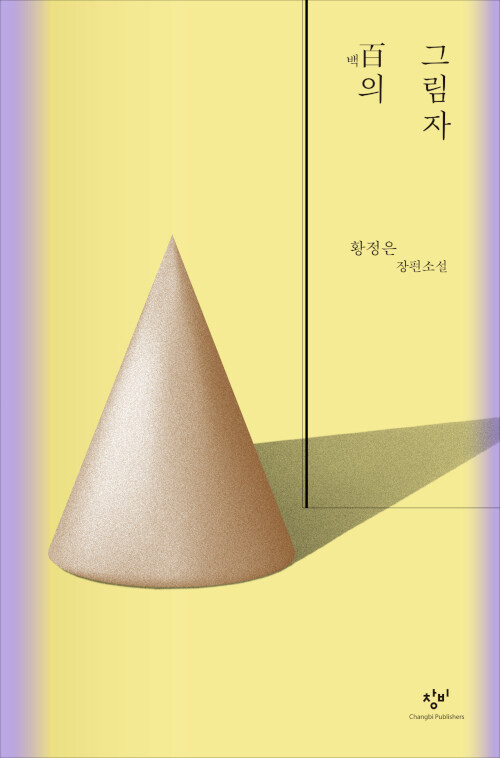 2005년 등단한 작가 황정은이 2010년에 발표한 첫 장편소설이다. 이 작품은 출간 당시부터 문학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황정은식’ ‘황정은풍’ 등의 용어를 유행시킨 바 있으며, 연극이나 만화 등 독자들의 자발적인 2차 창작물로 제작되기도 했는데요,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기발한 상상력과 황정은만의 인장이 새겨진 문장으로 스러지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대와 풋풋한 연애감정을 절묘하게 형상화했습니다.
|
| ■ 백의 그림자(2010) ■ 일시 : 3.20 (일) 오전10:30 ~ 오후1:30 ■ 장소 : 복합문화공간 에무 |
목차
[2] 이 작품의 화자 - 은교
[3] 무재
[4] 공간적 배경 – 철거되는 세운상가, 새로 만들어진 공원
겨울이 되기 직전, 전자상가 다섯 개의 건물 중 첫 번째 건물의 철거가 결정되었다.
월요일에 준공식이 있었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나 이따금 볼 수 있는 공무원들과 기자들이 왔다.[...] 이튿날 출근하는 길에 신문 가판대에 들러보니 한결같이 전자상가 철거, 역사속으로, 라는 방향의 제목을 달고 있었다. [...]
당장 철거되는 것은 다섯 개의 건물 중 가동 하나뿐인데도, 기사 제목이 일률적으로 전자상가 철거로 마치 상가 전체가 사라지고 말았다는 듯 구성된 것을 두고는, 그런 식으로 미리 상권을 죽여서 이
후의 일을 쉽게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미 죽어가고 있는 놈더러 자꾸 죽어라 죽어라, 한다며 여씨 아저씨는 입맛을 잃은 듯한 얼굴이었다. [...]
오무사는 이 과정에서 다시 사라졌다.
공원 주변으로 상가가 재정비되면서 부근의 상점들과 더불어 사라졌다. 오무사 노인의 것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가늘고 홀쪽한 그림자 하나가 어딘가로 이어진 채로 며칠 그 부근을 서성거리는 듯하더니 어느 날 그마저 사라졌다. [...]
봄에는 조경이 마무리 되었다. 장막이 모두 사라지고 첫 번째 공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짤막하게 올라온 잔디의 빛깔이 푸르고 싱싱했다.
테니스코트처럼 예쁘장한 모습이었다.
무재씨와 나는 늦게까지 상가에 남아 있다가 공원으로 내려갔다.
살금살금 걸어서 공원 가장자리에 설치된 긴 의자에 앉았다. 긴 의자는 네사람이 앉을 만한 길이였고 중간쯤에 얼핏 봐서는 팔걸이처럼 보이는 딱딱한 가로막대가 붙어 있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눠놓았을까요, 라고 묻자 눕지 말라는 의미죠, 라면서 무재씨는 의미 모르게 웃었다. (p.118-122)
은교씨는 슬럼이 무슨 뜻인지 아나요?
……가난하다는 뜻인가요?
나는 사전을 찾아봤어요.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도시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구역, 하며 무재씨가 나를 바라보았다.
이 부근이 슬럼이래요.
누가요?
신문이며, 사람들이.
슬럼?
좀 이상하죠.
이상해요.
슬럼.
슬럼.
하면 앉아 있다가 내가 말했다.
나는 슬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어도, 여기가 슬럼이라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요.
나야말로, 라고 무재씨가 자세를 조금 바꿔 앉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여기서 난로를 팔았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나 누나들하고 와보면 멀리서부터 그가 가게 앞에 의자를 내어두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숭 었어요. 우리가 오면 그는 어딘가로 사라졌다가 잠시 뒤에 나타나선 신문지에 싼 순대를 먹으라고 내주곤 했어요. 나는 아버지 곁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길게 자른 순대를 베어 먹었고요. [...] 어린 마음에도 나는 이렇게 호객하는 아버지를 보는 것. 당황스럽고, 사람들이 그가 하는 말을 못 들은 척하며 지나가는 것이 싫어서 종종 울었거든요.
[...] 나는 이 부근을 그런 심정과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데 슬럼이라느니, 그런 말을 들으니 뭔가 억울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가난하다면 모를까, 슬럼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치 않은 듯해서 생각을 하다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무재씨는 말했다.
언제고 밀어버려야 할 구역인데, 누군가의 생계나 생활계,라고 말하면 생각할 것이 너무 많아지니까, 슬럼, 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해버리는 것이 아닐까.
그런 걸까요.
슬럼, 하고.
슬럼.
슬럼.
슬럼.
이상하죠.
이상하기도 하고.
조금 무섭기도 하고, 라고 말해두고서 한동안 말하지 않았다. (p.124-127)

[5] 그림자
[6] 작품의 소재들 – 가마, 쥐며느리, 항성, 마뜨로슈까
[7] 작품의 시작과 끝부분
무재씨는 여전히 엔진 덮개를 열어둔 채로 이제는 일어서서 덮개 속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묵묵히 생
각에 잠긴 무재씨의 뒤꿈치로부터 짙은 빛깔로 늘어진 그림자가 주변의 것들과는 다른 기색으로 곧장
벌판을 향해 뻗어 있었다. 불빛의 가장자리에서 벌판의 어둠이 그림자를 빨아들이고, 그림자가 어둠에
이어져, 어디까지가 그림자이고 어디부터가 어둠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 마치 섬 전체가 무재씨의 그림
자인 듯했다.
[...] 막막하고 두려워 사발 모양의 가로등 갓을 올려다보았다. 여기는 어쩌면 입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둠의 입, 언제고 그가 입을 다물면 무재씨고 뭐고 불빛과 더불어 합, 하고 사라질 듯
했다.
[...] 걸어갈까요?
라고 말하자 나를 바라보았다.
……어디로?
나루터로.
……이렇게 어두운데 누굴 만날 줄 알고요.
만나면 좋죠, 그러려고 가는 거잖아요.
만나더라도 무재씨, 그쪽도 놀라지 않을까요, 우리도 누구라서, 라고 말하자 무재씨가 고개를 기울이고 나를 바라보았다. [...]
가로등 불빛 속에 덩그러니 차가 남아 있었다. 그림자 하나가 그 곁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거리가 상당한 데다 어둠으로 바닥이 지워져 무재씨 것인지 내 것인지 알아볼 수는 없었다. 갸름한 덩어리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는 것처럼 서 있다가 천천히 이쪽을 향해 움직였다. 불빛의 가장자리에서 어둠으로 들어서고 나서는 몇차례 흔들리는 것이 보이고 난 뒤로 더는 보이지 않았다.
따라오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따라오는 그림자 같은 것은 전혀 무섭지 않았다. [...]
은교씨,
하고 무재씨가 말했다.
노래할까요.(p.181-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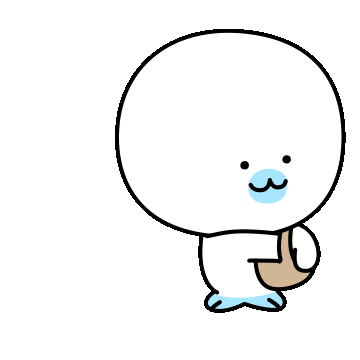
'토론기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01-2.컨테이젼(2022.05.28) (0) | 2022.05.28 |
|---|---|
| 01-1.불안의 사회학(2022.5.14) (0) | 2022.05.15 |
| 056.블러드 차일드 (2022.1.29) (0) | 2022.01.29 |
| 055. 김약국의 딸들(2021.11.27) (0) | 2021.11.30 |
| 054.<돌봄선언> (2021.10.23,더 케어 컬렉티브) (0) | 2021.10.24 |




댓글